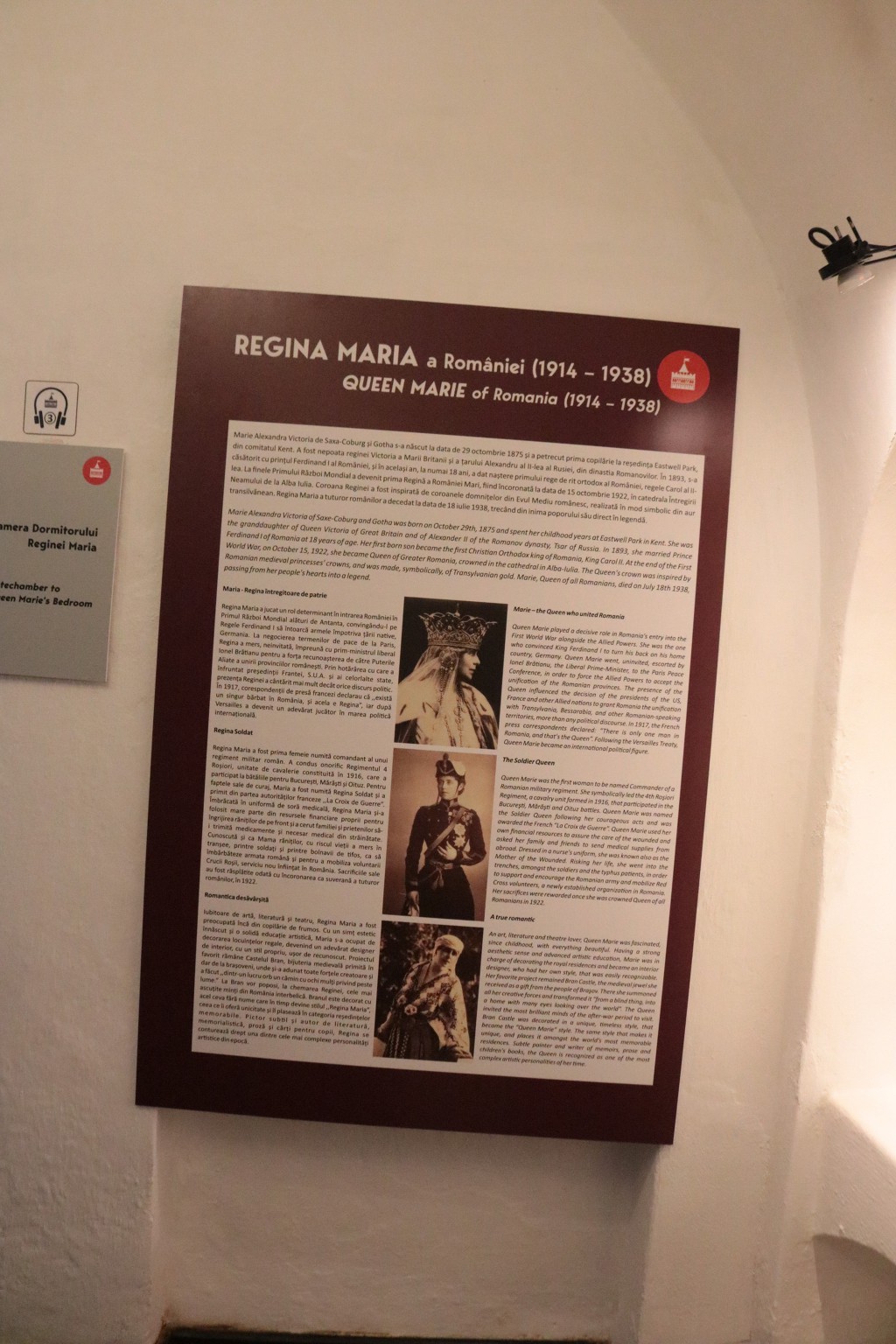여행지 : 아테네 시가지 투어
여행일 : ‘23. 3. 22(수)-29(수)
세부 일정 : 아테네→수니온→아테네→산토리니→아테네→델피→테르모필레→메테오라→아테네
특징 : ① 그리스(Greece) : 발칸반도의 최남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신화의 나라이자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불린다. 서구 문명과 민주주의가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과학과 철학을 발달시켜 서양 문명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 그리스 문명을 서양 문명의 요람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② 아테네(Athens) : 그리스의 수도로 서구 문명의 발생지이자 고대 문명의 많은 지적·예술적 사상이 비롯된 곳이다. 기원전 800년경에 나타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 중 하나로, 활발한 해상활동으로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했으며, 개방적인 성향의 문화가 성립되면서 민주 정치가 발달했다. 기원전 5세기와 4세기경 아테네가 이룬 문화적·정치적 업적이 당시 유럽 대륙의 여러 지역에 영향을 끼쳐, 이 도시는 서구 문명의 요람이자 민주주의의 고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경기가 열렸으며, 108년 뒤인 2004년 하계올림픽을 다시 개최했다.
▼ 아테네 관광의 핵심은 고대 신전과 공공건물, 거기에 도시의 뒷골목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고대신전(아크로폴리스)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 먼저 도심의 풍경을 엿보기로 한다. 그렇게 찾은 곳은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국회의사당’. 그리스 왕국의 초대 왕 ‘오토’를 위한 궁전으로 1836년 바이에른 건축가 ‘가르트너’가 설계했다. 80년 동안 궁전으로 사용되다가, 1924년 그리스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행정부가 사용했고, 1935년 의회가 들어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지도에 표기된 일정과는 약간 다르게 진행됐다. 고린도 대신 수니온에 들렀다.

▼ 국회의사당 앞 벽에는 ‘무명용사의 비(Monument of the Unknown Soldier)’가 있다. 그리스-튀르키예(터키) 전쟁(1919~1922년, 그리스 왕국의 패전)이 끝난 이듬해에 세웠는데,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앞면에는 병사의 모습, 양쪽에는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명언이 새겨져 있는데 오른쪽은 ‘영웅들에게는 세상 어디라도 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 왼쪽은 ‘누워 있는 용사를 위해 빈 침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란다.

▼ 벽면에는 그리스가 참전해왔던 전쟁을 기념하는 동판(銅版)이 붙어 있다. 한국전 참전 기념 동판(KOPEA=KOREA의 그리스어)도 보인다. 한국전쟁 당시 그리스는 1개 대대 849명(나중엔 2000명을 넘기기도 했다)의 병력을 파병했다. 이들은 미군에 배속되어 원주전투 등에서 용명을 떨쳤다고 한다.

▼ 묘역은 ‘에브조네스(Evzones)’라는 풍성한 치마 형태의 전통복장을 입은 의장병들이 이 지킨다. 붉은색 모자, 흰색 치마에 방울이 달린 가죽 구두를 신은 이들의 모습은 아테네의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들의 복장은 오스만튀르크 시절 독립투쟁을 벌인 민병대원들의 복장에서 유래한 것이란다. 치마의 주름은 모두 400개로, 오스만튀르크 치하 400년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고 한다. 아테네의 명물이라는 근위병 교대식은 시간을 맞추지 못해 구경할 수 없었다.

▼ 국회의사당 옆에는 ‘엘레프테리오스 베니젤로스(1864~1936)’의 동상이 서 있었다. 정치인이자 혁명가로써 그리스왕국과 그리스 제2공화국의 총리직을 여덟 번이나 역임하며 정치·사회 개혁을 주도하고, 군비를 확장해 영토를 넓혀 국가의 기틀을 다져 놓은 현대 그리스의 국부(國父)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아테네 국제공항의 정식 명칭도 그의 이름을 딴 ‘베니젤로스 국제공항’이라니 기억해 두자.(시진이 잘못 나와 남의 것을 빌려왔다)

▼ 구시가지와 국회의사당 사이에 위치한 ‘신타그마 광장(Syntagma square)’은 정치와 교통의 중심지다. 아테네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아테네에서 그리스 각지로 뻗는 거리는 이곳을 기점으로 삼는다. 신타그마는 ‘헌법광장’이라는 뜻인데, 1843년 이곳에서 최초의 헌법이 공포되었다고 한다. 광장에서 뻗어나간 에르무(Ermou)거리·미트로폴레오스(Mitropoleos)거리는 대표적인 쇼핑가이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빈다.

▼ 차창 밖으로 바라본 ‘아테나 학당(Akademeia)’.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세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다. 건물 앞 기둥 위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아테나 여신과 악기를 들고 있는 아폴론 신이 올라가 있다.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고 아폴론은 ‘학문과 예술의 신’이다. 둘이 합쳐지면 ‘아카데미’를 상징하게 된다나?

▼ 요새 이름은 ‘아테네대학교’. 정식 이름은 ‘아테네 국립 카포디스트리아스 대학교’인데, 그리스 독립 전쟁의 지도자였던 요안니스 카포디스트리아스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다고 한다. 1837년 5월 3일 그리스의 오톤 국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서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 차창 밖으로 스쳐지나간 ‘하드리아누스의 문’은 다른 분의 사진을 빌렸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AD76~138)’가 131년에 만든 문으로 기존의 아테네를 확장하는 하드리아누폴리스를 건설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 다음은 ‘파나티나이코 스타디움(Panathenaic Stadium)’이다. ‘제1회 올림픽(근대 올림픽의 시초)이 열린 곳으로 고대 아테네 시대에는 판 아테네 대축제가 이곳에서 열렸다. 저 경기장은 1895년 제1회 올림픽 개최 당시 그리스 부호인 ‘아베로프’가 낸 기부금으로 복원됐다고 한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대리석 좌석과 말굽 모양의 트랙은 고대 경기장을 그대로 복원시킨 것인데, 고대에는 관람석이 없었으나 로마시대 대부호인 ‘헤르데스 아티쿠스’가 대리석으로 만들어 기증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후 소실되었고 근대에 와서 아베로프에 의해 다시 복원되었다. 경기장은 45000명의 관중을 수용 할 수 있다.

▼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밖에서도 경기장 내부를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데, 굳이 5유로의 입장료를 내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이다. 참! 이곳은 BC 490년 고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던 때 한 아테네 병사(Fidipitz)가 달려와 아테네 시민들에게 마라톤 평야에서의 승전소식을 알리고 쓰러져 숨을 거둔 장소이기도 하다.

▼ 안내판은 경기장의 길이가 268.31미터이고, 너비가 141미터임을 알려준다. 트랙의 길이는 191미터라고 한다. 그밖에도 여러 제원이 상세하게 적혀있으나 설명은 생략.

▼ 출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시간이 없음을 핑계 삼아 발길을 돌린다. 주어진 10분 안에 경기장을 모두 둘러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 경기장 입구에는 그리스의 사업가이자 박애주의자인 ‘게오르기오스 아베로프(Georgios Averoff)’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1896년 하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의 후원금을 제공하고 올림픽 접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란다.

▼ 경기장 조감도인 모양인데, 영어는 한 단어도 보이지 않는다.

▼ 안내판은 2500년 마라톤의 역사를 전한다. BC 330년 ‘고대올림픽(BC 776년 최초로 개최되었다고 기록은 전한다)’이 열렸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140년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경기장을 개축하면서 좌석을 5만 석으로 늘렸다. 현재의 경기장은 1896년 첫 근대올림픽을 위해 건축되었다. AD 393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폐지되었던 올림픽이 1,500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근대올림픽 대회로 재탄생 한 것이다. 108년이 지난 2004년에는 또 한 번의 올림픽(우리나라는 금메달 9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9개로 종합 9위를 기록했다)이 이곳 아테네에서 열렸다.

▼ 다음 방문지는 ‘모노스트라키 광장’이다. 아니 광장 근처에 서는 벼룩시장이다. 차에서 내리니 그래피티(graffiti)로 도배된 건물이 눈에 띈다. 1970년대 브롱스(뉴욕) 빈민가의 거리 낙서로 시작했던 것이 언제부턴가 예술의 한 장르로 어엿이 자리 잡았다. 내 눈에는 타인의 재산권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여겨질 따름이지만.

▼ 잠시 후 벼룩시장이 나온다. 매주 일요일 ‘모나스트라키 광장’ 인근 골목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목요일, 그런데도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어찌된 일일까? 까짓 그게 무슨 대수인가. 해외여행에서 벼룩시장을 찾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니, 우린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될 일이다.

▼ 앙증맞은 도기 인형, 출처를 알 수 없는 조잡한 조각상들…. 거리의 좌판에는 없는 것 없이 그득했다. 참! 이곳은 ‘고대 아고라’의 근처라고 했다. 아테네의 아고라는 고대 아테네의 메인 스트리트로, 시장·신전·정부청사·감옥 등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그렇다면 저 벼룩시장은 고대 아고라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 조금 더 걸으니 유적지 발굴현장이 나온다.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라고 하는데, 널브러져 있는 건물의 잔해 너머로 아크로폴리스가, 다른 한편에는 아레오파고스 언덕이 보인다.

▼ ‘아고라(agora)는 ‘시장에 나오다’, ‘사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 ‘아고라조(Agorazo)’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는 ‘시장’이란 의미로 쓰였다. 그러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뜻하게 된다. 민회(民會)나 재판·상업·사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민생활의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다. 오늘날에는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널리 사용된다.

▼ 근처에는 ‘로만 아고라’도 있다고 했다. 로마인들이 ‘고대 아고라’를 대체할 목적으로 조성했다는데 가보지는 못했다. 아니 방문 당시만 해도 아고라 유적이 고대아테네와 로마 지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도 몰랐다. 참고로 로마 시대에는 아고라를 ‘포룸(forum)’이라고 불렀다.

▼ 안내판은 번역이 귀찮아 naver 지식백과에서 빌려왔다. <기원전 6세기 참주 정치 시대에 만들어진 아테네의 아고라는 대략 550×700m 크기의 직사각형 광장의 3면을 주랑으로 에워싸고 있으며, 주변에 커다란 공공건물들이 들어서 균형 있는 배치를 이루고 있다. 1931년 ASCSA(American School of Classical Studies at Athens)에 의해 발굴되었다. 1950년대에는 아고라 동쪽의 아탈로스 주랑(Stoa of Attalos)이 재건되어 오늘날 아고라 박물관 등으로 쓰이고 있다.>

▼ 마침 지하철이 발굴현장을 스치듯 지나간다. 그런데 바깥 면이 온통 그래피티로 도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낯선 풍경이었다.

▼ 아고라 주변답게 노점상들이 늘어섰고, 야외에 테이블을 내놓은 카페와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곳은 오가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늘 북적인다고 했다.

▼ 이후부터는 꽤 번화한 골목을 걸었다. 노천카페들이 줄지어 있고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을 파는 상점도 많았다.

▼ 식당이나 카페는 예외 없이 야외에 의자를 놓아두었다. 커피 한 잔 놓고 몇 시간이고 대화한다는 그리스인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한마디로 이 골목은 현대의 아고라라고 할 수 있겠다.

▼ 이곳 그리스도 군복이 대세인 모양이다. 군복과 군장을 파는 상점이 여럿 들어서 있었다.

▼ 드디어 ‘모나스트라키 광장(Monastiraki square)’이다. 모나스티라키는 ‘작은 수도원(monastery)’이라는 뜻으로, 광장의 한쪽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갈색 수도원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아테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자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 광장 주위에는 유명한 타베르나와 노천카페들이 줄지어 있고, 상품을 진열해놓은 상점들도 꽤 많다. 과일 노점상도 그 가운데 한 자리를 당당히 꿰차고 있었다

▼ 지하철역처럼 생겨 살짝 들여다보았다. ‘모노스트라키역’이 아닐까 싶다.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만난다는...

▼ 누군가 ‘성 아포스톨루(Apostolou)성당’이라고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는 또 아포스톨루 성당이 고대 그리스 유적이 아니라 비잔틴 시대의 유적이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일부만 복원된 벽화와 천정화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 아크로폴리스 쪽으로 올라가다보니 요런 유적지가 얼굴을 내민다. ‘치스타라키스 사원(Tzistarakis Mosque)’이라는데, 오스만 제국이 아테네를 정복했을 때 ‘치스타라키스’라는 파샤가 세운 사원이라고 한다. 현재는 전통 도자기·민속예술·민속악기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단다.

▼ 혹자는 아담은 이브에게 갈비뼈를 주었고 제우스 신전은 치스타라키스 사원에게 기둥을 주었다고 했다. ‘치스타라키스’가 저 사원을 짓기 위해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의 17번째 기둥을 뽑아 사용했다는 것이다.

▼ 아테네 투어의 마지막은 ‘아크로폴리스’의 조망으로 꾸몄다. 언덕 위의 고성이 한눈에 쏙 들어오는 카페(야외 테이블)에 앉아 시원한 생맥주를 마시며 낮과는 또 다른 아크로폴리스를 올려다봤다.

▼ 아크로폴리스에 조명용 불이 켜졌다.

▼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아크로폴리스.

▼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데 밤하늘에서 초승달과 별이 손을 흔들어준다. 일정에 쫓겨 마지못해 일어나는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 아테네에 머무는 동안 사용했던 ‘Xenophone Hotel’. 이 호텔은 개인 짐을 직원이 수동식 기계를 이용해 계단위로 올려주는 게 특징이다. 엘리베이터의 문도 수동으로 밀어야만 열린다. 하나 더, 여행사에서는 욕실 일회용품과 드라이기, 커피포트를 알아서 챙겨오라고 했었다. 하지만 칫솔·치약과 면도기 말고는 모두 제공되고 있었다.

'해외여행(유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리스 여행 ③ : 먼 항해 떠나는 그리스인들의 염원, 수니온곶의 포세이돈신전 (2) | 2024.01.04 |
|---|---|
| 그리스 여행 ② : 신들을 향한 찬미가 빚어낸 아테네의 심장, 아크로폴리스 (1) | 2023.12.28 |
| 루마니아 여행 ⑩ : 트란실바니아 수도였던 루마니아 제2의 도시, 클루지나포카 (0) | 2020.04.30 |
| 루마니아 여행 ⑨ : 테마파크로 되살아난 중세의 소금광산, 살리나 투르다 (0) | 2020.04.20 |
| 루마니아 여행 ⑧ : 아담하고 차분한 작센인들의 옛 도시, 시기쇼아라 (0) | 2020.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