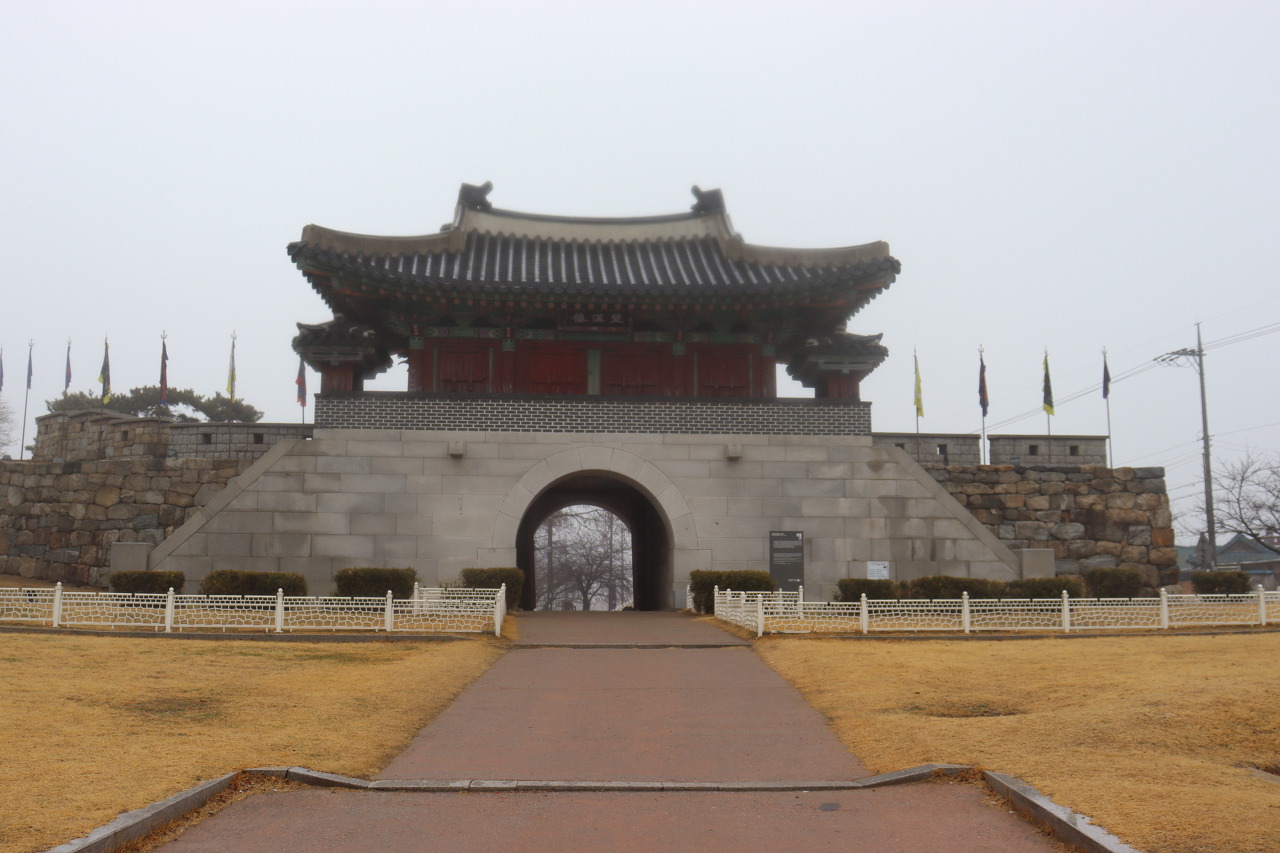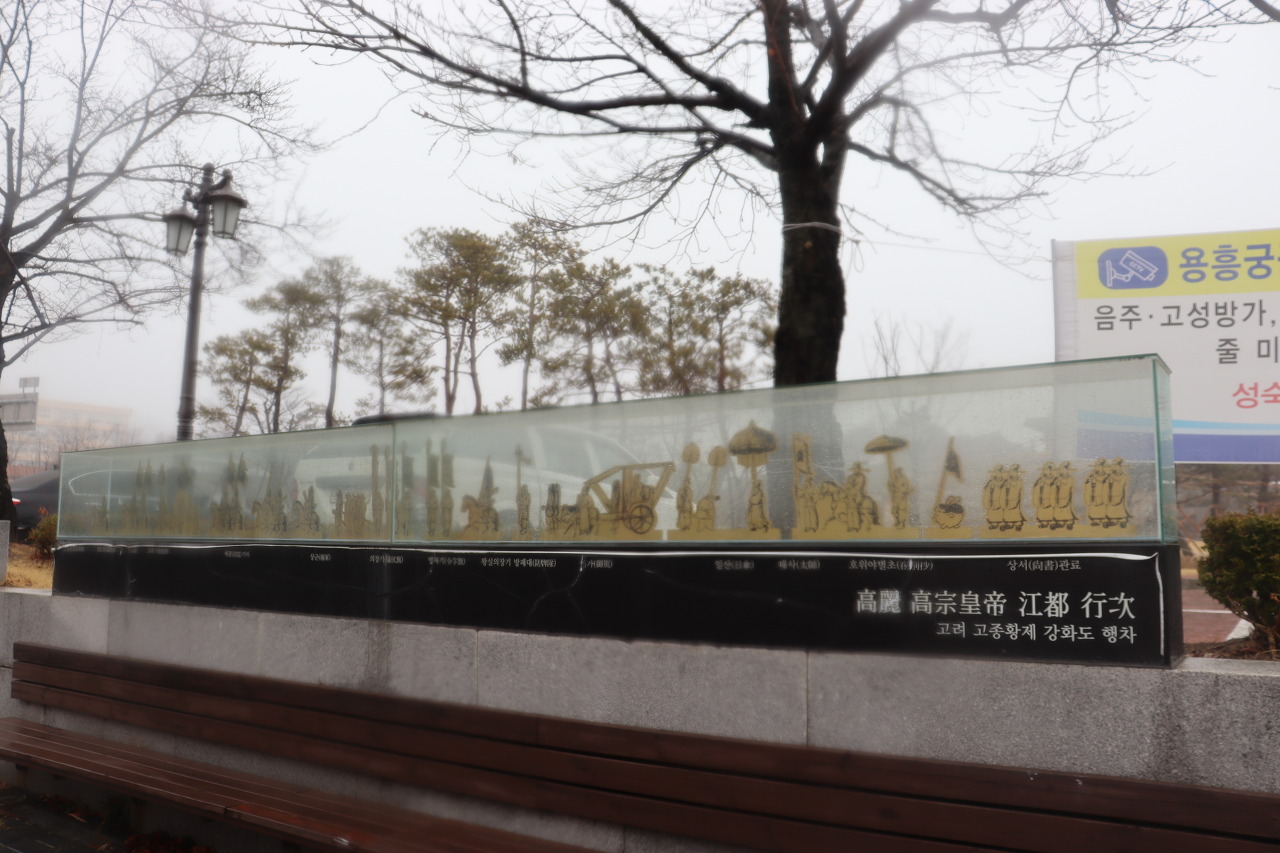강원도 평화누리길 11코스(양구 돌산령길)
여행일 : ‘23. 9. 17(일)
소재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및 해안면 일원
여행코스 : 팔랑리→대암산용늪 탐방안내소→도솔산 전적지→돌산령 정상→해안입구(거리/시간 : 16km, 실제는 대암산 용늪 탐방안내소부터 10.7km를 3시간에)
함께한 사람들 : 청마산악회
특징 : ‘평화누리길’이란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의 서해안 강화도에서 강원도 동해안 고성까지의 접경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자전거 길이다. 이중 강원도 관내(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경유)를 ‘강원도 평화누리길’이라 부르는데 생태·평화의 상징공간인 DMZ 일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20개 코스(370.6km)로 구성됐다. 분단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지는 길,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평화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 들머리는 월운저수지 상부(양구군 동면 월운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IC에서 내려와 46번 국도를 타고 양구읍까지 온다. 송청교차로(국토중앙면 죽리)에서 31번 국도(양구·해안방면)로 옮겨 ‘금강산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월운저수지’에 이른다. 댐의 상부에 ‘평화누리길’ 및 ‘DMZ평화의 길’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 팔랑리(양구군 동면)에서 시작해 해안입구(양구군 해안면)에 이르는 16km짜리 구간. 하지만 팔랑리의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해랑길 같은 공식적인 트랙이 없음은 물론이고 선답자들의 기록도 중구난방. ‘가톨릭 팔랑리공소’를 기점으로 삼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곳 월운저수지(같은 동면이지만 ‘월운리’다)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아무튼 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대암산 용늪 탐방안내소’ 앞에서 출발하는 꼼수를 사용했다.

▼ ‘평화누리길’은 자전거 길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 같은 ‘걷기 여행자’들은 들러리인 셈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평화누리길’보다 새로 개통되는 ‘DMZ평화의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미 개통구간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걸으면 될 것이고 말이다.

▼ 이 구간은 ‘DMZ평화의 길(27코스)’도 함께 간다. 평화누리길(강원도 11코스)과 종점만 다를 뿐 시점은 같기 때문이다. 아니 월운저수지 구간은 두 탐방로가 약간 다르게 나있다고 했다.

▼ 일단은 도로 건너에 있는 ‘피의 능선 전투전적비’부터 둘러보기로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무한책임임과 동시에 우리네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의무가 아니겠는가. 참고로 ‘피의능선 전투(Battle of Bloody Ridge)’는 1951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20일간) 벌어진 전투다.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 중 하나였던 이 전투를 기억하고,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적비를 세웠다.

▼ ‘피의능선 전투’는 국군이 휴전회담을 진척시키는 동시에 휴전에 대비하여 중요한 요충지(캔사스선 북방 10~20km 지역에 위치한 수리봉 일대)들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공격작전이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1개 연대 규모, 그리고 북한군 1개 사단 규모의 사상자(1,480여 명이 사살되고 70여 명이 생포)가 발생하자 미군 신문(Stars and Stripes)이 ‘피의능선 전투’라 이름 지었다. 이 전투의 승리로 북한군은 펀치볼 북쪽 능선으로 물러난다.

▼ 실제는 ‘대암산 용늪 탐방안내소’ 앞에서 출발했다. ‘돌산령 옛 고갯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출발할까도 했지만, 경사만 가파를 뿐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 생략했다. 특히 쉼터용 정자에 화장실까지 갖추었으니 출발지점으로 이만한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참고로 대암산의 1,280m 구릉지대에 형성된 용늪은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남한에서 처음 발견된 고층습원(高層濕原)으로 다양한 지연환경과 동·식물을 갖고 있어 1989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1997년에는 국내 최초로 람사르 조약의 습지로 등록되었다.

▼ 용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탓에 일정 기간에 제한된 인원에게만 탐방을 허용한다. 탐방안내소는 이곳 말고도 인제군의 서흥리(10년 전 내가 이용했던 곳이다)와 가아리가 있다. 아무튼 민간통제선 안에 자리 잡고 있어 군의 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저처럼 문이 굳게 닫혀있는 이유일 것이다.

▼ 10 : 14. 돌산령 옛 고갯길(돌산령 터널이 생기기 전 양구에서 해안으로 갈 때 이용하던 지방도)을 올라가며 트레킹이 시작된다. 이 구간(12.34km)은 갓길이 따로 없는 왕복 2차선 도로다. 산자락 쪽으로 파란 선을 그어 ‘자전거 길’을 구분하고 있으나 안전 확보는 라이더(보행자 포함)의 몫이다.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랄까?

▼ 이정표는 돌산령 정상까지 4.7km가 남았음을 알려준다. 11코스가 시작되는 팔랑리까지는 5km. 딱 그만큼 단축했다고 보면 되겠다.

▼ 돌산령 정상까지는 400m 이상 고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길은 경사를 거의 못 느낄 정도로 평탄하다. 하긴 5km를 걸으며 400m만 높이면 되니 서두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몸이 편하면 마음까지도 여유로워지나 보다. 심심찮게 변하는 주변풍광에 눈 맞추며 걸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 절개지의 비탈진 사면에 박아놓은 락볼트(soil nailing공법). 도로개설 당시의 어려움을 대변해준다.

▼ 길가 산비탈은 ‘산딸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초여름에는 흰색의 화려한 꽃으로, 가을에는 붉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사로잡는 나무다. 그 열매가 딸기와 비슷하게 생겨서 ‘산딸나무’라 부른다. 그나저나 붉고 고운 열매가 군침을 돌게 해 따먹어 봤다. 하지만 약간 달달할 뿐 즐겨 찾을만한 과일은 아닌 것 같다.

▼ 10 : 31. 첫 번째 쉼터(이정표 : 정상까지 3.9km)에 닿았다. 오르막길을 힘들게 올라온 이들에 대한 배려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 자전거 거치대는 기본. 파고라 모양으로 만든 쉼터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지붕까지 씌웠다. 전천후인 셈이다. 그나저나 쉼터라고 해서 꼭 쉬었다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쉼터는 있는 자체로만으로도 나그네에게 기쁨을 준다.

▼ 옛 고갯길은 군인 통제 하에 있다고 봐야겠다. 길 양쪽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은 기본. 도로도 순찰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다. 길섶에 핀 야생화를 촬영하는 중인데, 순식간에 차량이 나타나더니 도로를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를 내릴 정도였다.

▼ 갖가지 경고용 현수막도 이 구간의 특징 중 하나다. 민통선 이북의 군사시설보호지역이라서 무단출입 및 채집·영농활동을 금지한단다.

▼ 순찰차의 말마따나 철조망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울타리는 또 북한에서 넘어오는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의 차단막까지 겸하고 있나보다.

▼ 무단출입은 물론이고 사진촬영까지 금지한단다. 전적지를 안내해주던 병사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카메라나 핸드폰은 꺼내지도 말라며 겁을 주고 있었다.

▼ 그나마 이건 부탁에 가깝다.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주요서식지이니 아끼고 보호해주잔다.

▼ 가끔가다 허락되지만 조망 또한 주요 볼거리다. DMZ 방향의 산하가 널따랗게 펼쳐지는데, 지대가 높아서인지 운해로 뒤덮여 있었다.

▼ 올 여름, 무섭게 쏟아지던 빗줄기는 이곳에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산사태가 도로를 덮친 곳에서는 위험을 무릅쓴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

▼ 도로가 유실되다시피 한 곳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 가끔은 저런 급경사 구간이 나타나기도 한다. 1,050m(돌산령 정상)까지 고도를 높여야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맞다. ‘DMZ평화의 길(27코스)’ 안내판은 이 구간을 물리적 난이도가 높다고 적고 있었다.

▼ 10 : 55. 24분쯤 더 걸어 두 번째 쉼터를 만났다. 이정표는 정상까지 2.2km가 남았음을 알려준다. ‘돌산령 고갯길’ 신·구도로가 나뉘는 삼거리에서 정상까지의 거리가 6km라고 했으니 대략 2km마다 쉼터를 만들어놓은 셈이다.

▼ 돌산령 인근은 ‘DMZ 야생화벨트 사업’이 시행된 모양이다. 청사초·김의털·비비추·꿀풀·기린초 등을 심고, 흰민들레·질경이·구절초·벌개미취 등은 씨앗을 뿌렸단다. 시간이 흐르면 ‘동아시아 그린브릿지 연결’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은 몰라도 야생화를 구경하려는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오겠다.

▼ 이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자. 주목·분비·거제수 등을 보호하고 있단다.

▼ 안내판에 이끌려 카메라의 초점을 야생화에 맞춰본다. 가장 먼저 잡힌 것은 ‘개미취’. ‘들국화’라 부르는 국화과 꽃의 얼굴마담이다. 참고로 ‘들국화’란 산국·감국·쑥부쟁이·개미취·구절초 등등 산과 들에 피는 국화과의 꽃들을 싸잡아 부르는 이름이다.

▼ 생김새가 조금 다르나 이것 역시 ‘개미취’다.

▼ 요건 ‘구절초’, 세분류하면 ‘낙동구철초’란다. 모 대학 도예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여사친’ 산우가 심심찮게 보내주는 차의 원료이기도 하다. 가끔 이 차를 마시는데 은은한 노란빛이 우려난 차색도 곱지만 향도 정말 일품이다. 향긋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을 정도로...

▼ 블루 마거리트(Blue Marguerite)로도 불리는 ‘블루데이지(Blue Daisy)’이다. 한국 이름은 ‘청화국’이라나?

▼ ‘백공작’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쑥부쟁이’다. 싸잡아서 ‘들국화’로 부르는 국화과의 꽃들은 종류도 많다. 꽃의 생김새도 구분이 불가능 할 정도로 비슷비슷하다. 작은 꽃들이 총총하게 피는 ‘미국쑥부쟁이’가 유일하게 뚜렷한 차이점을 본인다고나 할까?

▼ 작약, 당귀, 황기, 지황과 더불어 5대 기본 한방 약재 중 하나로 꼽히는 ‘천궁’도 꽃을 활짝 피웠다.

▼ 야산에서 피는 구절초나 개미취와는 달리 심산이나 고원에서나 만날 수 있는 ‘체꽃(스카비오사)’도 눈에 띈다. 꽃봉오리의 모양이 구멍 뚫린 체를 닮았다고 해서 ‘체꽃’이란 이름을 얻었다. 스카비오사(Scabiosa)는 ‘옴’이란 뜻의 라틴어, 이 꽃이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 11 : 29: 굽이굽이 돌산령길을 돌아올라 ‘도솔산전적지’ 입구에 이른다. 하지만 군인들이 딱 막고 섰다. 그들의 안내를 받아야만 탐방이 가능하단다. 말이 안내지 전적지를 둘러싼 울타리를 넘을 것을 대비한 경계가 아닐까 싶다.

▼ ‘도솔산 전적지’의 입구임을 알리는 빗돌. 붉은 글씨로 적힌 ‘무적 해병’이 눈길을 끈다. 도솔산 전투의 승리를 치하하며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준 휘호라고 한다. 한편 도솔산 전투를 기리는 ‘도솔산가’라는 군가가 제정되기도 했단다.

▼ 도솔산(兜率山, 1,148m)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도 ‘도솔산 전적지’를 가리킨다. 전적지 뒤로 길이 나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 완주하면 담낭이 튼튼해진다는 ‘양구 십년장생 길(4년길)’ 안내판도 눈에 띈다. 도솔산과 대암산 정상을 거쳐 양구생태식물원으로 떨어지는 4코스란다. 하지만 민통선 안이라서 통행은 불가. 길은 길이나 걷지 못하는 길인 셈이다.

▼ 11 : 34. 전적지는 꽤 넓게 조성되어 있었다. 위령비를 중심으로 한때 해병대의 주력 상륙장비로 사용되던 수륙양용장갑차. 그리고 비목을 연상시키는 나무 조형물들이 들어서 있다.

▼ ‘도솔산지구전투’는 6·25전쟁 당시 한국해병대 제1연대가 북한 공산군 제5군단 예하의 제12사단 및 제32사단이 점령 중이었던 도솔산(1,148m)을 혈전 끝에 탈환한 전투를 말한다. 첫 공격은 1951년 6월 4일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면 적의 공격을 받아 다시 빼앗기고, 또 빼앗는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24개 목표 고지를 6월 19일 완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전투에서 2,263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44명을 생포했으며, 아군 또한 7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악전 사상 유례 없는 대공방전으로 해병대 5대 작전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 평화나무·생명나무가 눈길을 끈다. DMZ을 횡단하는 평화·생명지내 체험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심었다는데,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에 통일의 집을 짓는다.’는 어느 단체의 홍보문구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 위령비는 나무 장승들이 지키고 있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그날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양구군 각 면에서 만든 것들이란다. 하지만 난 6.25 전쟁 당시 스러져간 무명용사들의 돌무덤과 철모가 올려진 비목(碑木)을 연상한다. 저 위령비가 그리 만들었을 것이다.

▼ 전적지에서의 조망도 뛰어난 편이다. 아까 고갯길을 올라오면서 바라보던 풍경이 다시 한 번 펼쳐진다. 아니 높아진 고도만큼이나 시야도 넓어졌다.

▼ 되돌아 나오는 길. 진행방향 저만큼에서 돌산령 정상이 고개를 내민다. 돌산령 정상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금지된다.

▼ 11 : 50. 돌산령 정상에 올라섰다. 하지만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사진촬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정상을 묘사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 군부대가 나오지 않도록 도로만 카메라에 담는다.

▼ 이곳이 ‘돌산령’의 정상이라는 표식은 일절 눈에 띄지 않았다. 그 흔한 이정표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저 이곳의 해발(1,050m, 내 앱은 980m를 찍고 있었다)을 적은 표지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을 따름이다.

▼ 헬기장 너머로 보이는 저 봉우리가 ‘도솔산(兜率山, 1,148m)’이 아닐까 싶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산, 때문에 웬만한 국내의 산을 다 올라봤지만 도솔산은 아직도 미답의 산으로 남아있다.

▼ 그렇다면 그 왼쪽에 있는 산의 정체는 뭘까. 도솔산보다 한참이나 더 높고, 망루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 몇 걸음 더 걷자 길이 나뉜다. 평화누리길은 계속해서 도로(돌산령 옛 고갯길)을 따른다. 왼쪽은 군의 관측기지인 ‘OP(observation post)'로 연결되니 진입하면 안된다.

▼ 왼쪽으로 가면 ‘호국 도솔암’이 나온단다. 한국전쟁 당시 여섯 번이나 주인이 바뀐 격전지 가칠봉이 인접한 최전방 군법당이다. 해발 1,070미터에 위치해 설악산 봉정암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절이란다.

▼ 11 : 56 – 12 : 21. 세 번째 쉼터에 이른다. 널찍한 공간에 전망까지 좋아 쉬어가기 딱 좋은 곳이다. 우리도 준비해간 간식을 서로 나누며 여유롭게 머물다 갔음은 물론이다.

▼ 판박이로 만들어놓았던 아까의 것들과는 사뭇 다르다. 많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도 넓히고 벤치도 여럿 배치했다. 그래선지 많은 이들이 이곳을 전망대로 분류하고 있었다.

▼ 발아래로 ‘펀치볼(Punch Bowl)’이 펼쳐진다. 아니 한 폭의 풍경화가 그려진다. 고산준령이 기다랗게 펼쳐지는가 하면 그 봉우리들을 운해가 감싸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양구 제일의 전망대 중 하나로 꼽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참고로 ‘펀치볼’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분지를 둘러싼 모습이 화채 그릇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 ‘펀치볼 평화누리길’ 안내판도 눈에 띈다. 2주 후에 걷게 될 12코스(양구 펀치볼길)일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평화누리길은 공식적인 지도가 없어 답사를 위한 준비나, 답사 후 기록을 남길 때 애로가 많다.

▼ 다시 길을 나선다. 이후부터는 내리막길이 계속된다.

▼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이 전형적인 가을 풍경을 연출한다.

▼ 12 : 33. 네 번째 쉼터에 다다른다.

▼ 건너편에는 ‘대암샘터’라는 약수터가 있었다. 사시사철 가뭄을 타지 않는 샘이라니 돌산령 고갯마루를 넘어온 라이더나 트레커들에게 감로수가 되어주기 충분하겠다.

▼ 그렇다고 샘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두꺼비 조형물의 입에 파이프를 박아 물이 흘러나오게 하고 있었다.

▼ 길은 굽이굽이 내리막의 연속이다. 그런 길을 걷다보면 요런 대전차 방어시설도 만나게 된다. 돌산령 옛길이 군사요충지라는 얘기일 것이다.

▼ 13 : 10. 다섯 번째 쉼터를 지났다싶으면 곧이어 ‘계곡 쉼터’를 만난다.

▼ 하지만 문이 닫혀있는 게 아닌가. 산림청의 ‘입산금지’ 팻말과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을 금한다는 군부대장의 서슬 퍼런 경고판도 세워져 있다.

▼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자물쇠를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안에는 ‘DMZ펀치볼 둘레길’ 탐방객들이 자연을 벗 삼아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안내판까지 세워놓았다.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는 얘기다.

▼ 작은 폭포가 겹겹이 쌓여있는 계곡은 머물다가기에 딱 좋은 환경이다. 아니 족탕이나 알탕을 즐기기에도 이만한 곳이 없겠다.

▼ 맞은편, 길 건너에 있는 ‘야생화공원’은 완벽하게 막혀있었다.

▼ ‘오유밭길’은 해안면의 ‘DMZ펀치볼 둘레길’의 4개의 노선(평화의길·오유밭길·만대벌판길·먼멧재길) 중 하나다. 바람꽃·노루귀·얼레지·제비꽃 등 북방계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고, 전쟁의 흔적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다.

▼ 하지만 진입로는 열쇠를 채워 출입을 막고 있었다. 안내판은 그 이유를 적었다. 곳곳에 미확인 지뢰가 있으므로 숲길 등산지도사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등산지도사를 대동할 때만 문이 개방된다는 얘기일 것이다.

▼ 13 : 30. 20분쯤 더 걸으면 453번 지방도에 내려서면서 트레킹이 종료된다. 첨부된 지도에 ‘해안입구’로 표시된 지점이다. 오늘은 3시간을 걸었다. 앱에 10.70km가 찍혀있으니 꽤 더디게 걸은 셈이다. 해발 1,050m의 돌산령 고갯마루를 넘는 게 만만찮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 이정표(해안면 4.9km/ 돌산령 정상 5.1km)는 지나왔거나 가야할 곳의 지명과 거리만 표시하고 있을 뿐, 이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11코스(양구 돌산령길)의 종점으로 알고 있는 내 앎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 종점 오른편은 ‘돌산령터널’이다. 저 직선코스를 놓아두고 만산령 옛 고갯길을 에돌아왔다.

'국내여행(트레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천 물줄기 거슬러 올라 미시령으로. 강원도평화누리길 15-1코스(인제 북면길) (2) | 2023.11.27 |
|---|---|
| 화채그릇을 닮은 해안분지서 통일을 배우다. 강원도 평화누리길 12코스(펀치볼길) (1) | 2023.10.18 |
| 분단의 아픔을 평화로 승화시키다. 강원도 평화누리길 9코스(양구 평화의 길) (2) | 2023.09.12 |
| 만경대산을 에돌아가며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들. '운탄고도 1330' 2길(김삿갓 느린걸음 굽이굽이길) (0) | 2023.08.14 |
| 옛 선비들의 풍류 따라 걷는, 함양 선비문화탐방로(화림동 계곡) (2) | 2023.03.13 |